한 소녀가 체스를 처음 배울 때부터 전세계 1위 체스 플레이어를 발라버릴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성장 서사다. <퀸스 갬빗>은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기반한 전기라고 한다. 체스 플레이 방법을 몰라도 보는 데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. 나는 체스 말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서사를 이해하는데 별 중요하지 않았다. 나는 주인공이 양부모에게 입양되면서부터, 고아원에 남아있던 흑인 친구와 수위 아저씨가 언제 나올지가 넘 기다려졌다. 나중에 수위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고, 원장 선생님의 재등장을 볼 땐 울컥했다.
체스 대회나 체스 플레이 씬마다 체스 판과 말이 달라진다. 같은 듯 보이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. 내가 본 바둑판과 알이나 장기판과 알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는데 체스판과 말은 모양새와 크기가 다양하단 걸 알게 됐다. 주인공의 환각으로 천장에 보이는 채스판과 말도 <퀸스 갬빗>의 한 캐릭터로 보였다.
주인공이 중독되는 알약이 뭔지 되게 궁금하다.
주인공이 성인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끝을 말려올린 빨간 단발 헤어 스타일은 마치 <퀸즈 갬빗>의 대표성처럼 각인된다. 주연을 맡은 인야 테일러조이도 그렇다. <퀸즈 갬빗>=빨간 단발머리의 인야 테일러조이로 기억될 것 같다.

기억에 남는 대사는 “Choices have consequences.”.
<퀸즈 갬빗> ★★★★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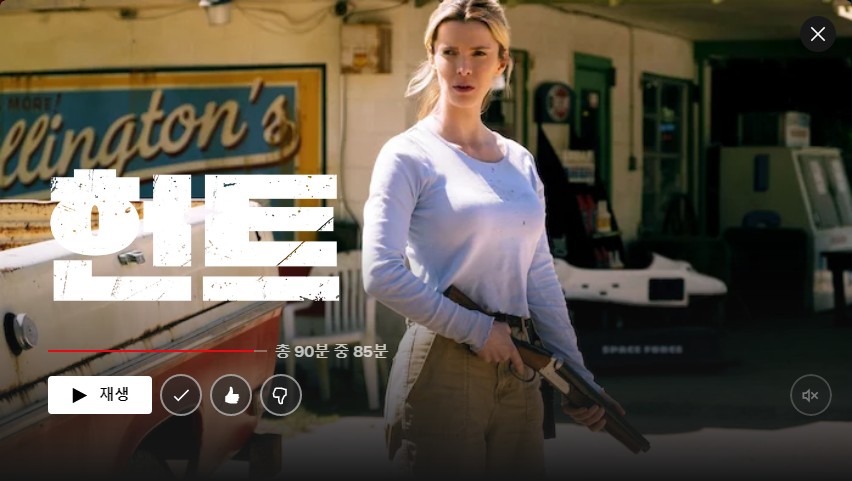



 >
>